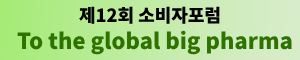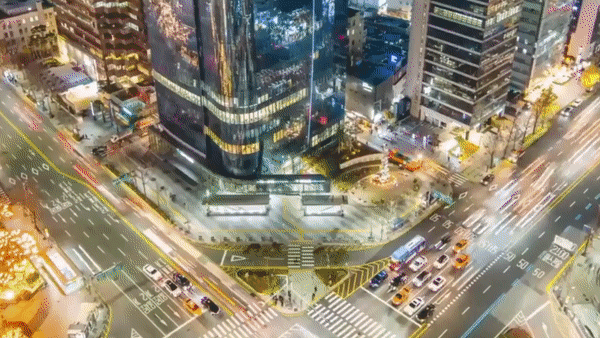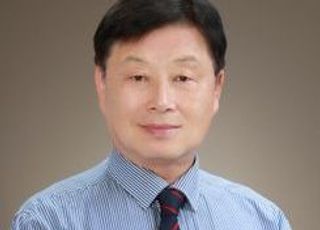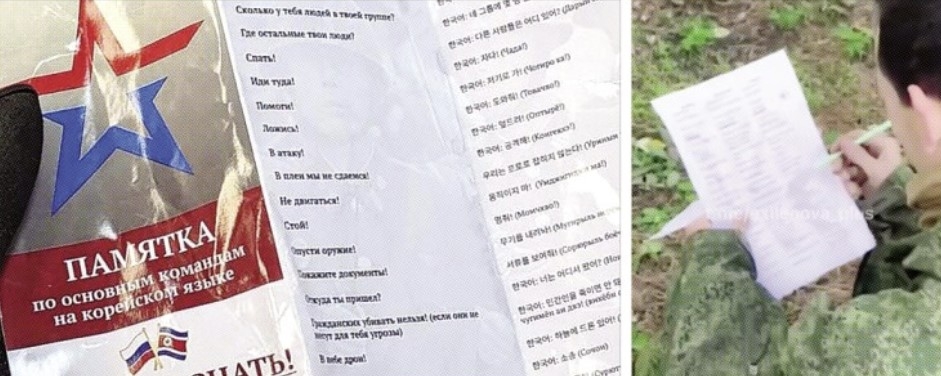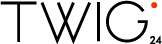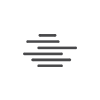
- 텍스트 축소
- 확대
[新금융법 진단-금소법上] 반쪽짜리 vs 시스템 마련
- 송고 2019.11.24 10:00 | 수정 2019.11.25 09:4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여야 시각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는 미반영
"DLF사태 전 금소법 있었다면 소비자보호 가능했을 것"

국회의사당 전경.ⓒEBN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사태를 계기로 10여년 잠들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전격 통과했으나 각론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하는 기본법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 규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금소법 3대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도입을 제외하고,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책임 주체를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입증책임전환'만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에 대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DLF 사태의 본질이 금융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 불완전판매라며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들지 않는 이상 DLF 사태는 또 발생할 것"이라며 "은행이 망할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론과 달리 징벌적 손배제는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판례가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영미법계에서 유래해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실제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해야 한다는 실손전보(實損塡補)의 원리를 준용하고 있다.
여야 간 일단 입법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이런 쟁점이 해소되지 않자 내용 자체를 제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숙성시키지 못하는 정무위의 '태업'을 지적하는 비판도 나온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8월 14일 무려 150일 만에 가동되기도 했다. '전무위'라는 조롱도 나왔다.
입증책임전환 역시 원안에는 포함됐던 적합성·적정성원칙이 제외되면서 소비자계에선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DLF를 판매한 시중은행이 상품 가입을 위해 투자성향을 기존보다 높게 변경하며 적합성 원칙과 자필기재 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불완전판매 사례의 다수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일정한 실효성은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번 금소법은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해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대거 담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