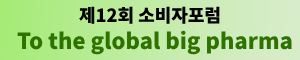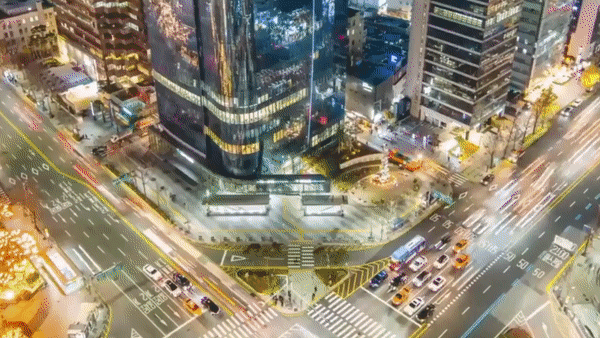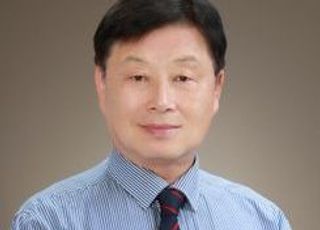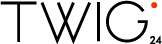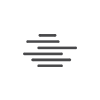
- 텍스트 축소
- 확대
중대재해법 시행 임박…산업계 "法모호성·이중처벌 보완 필요"
- 송고 2022.01.24 10:04 | 수정 2022.01.24 10:04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안전사고 책임 범위, 소재 둘러싼 '싸움' 불가피
기업들 중대재해에 '조치' 나서

ⓒ연합
산업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 모호한 법 내용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은 사고를 줄이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 등 혼란을 걱정하는 눈치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계는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해소되지 않은 법의 모호성에 살어름판을 걷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대재해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사처벌 수준이 훨씬 높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애매모호해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인 1년 이상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중첩해 부여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골자다. 이에 정부의 법령 해설서까지 나왔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해당 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대안 마련과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불명확한데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명시한 '적정한' 조직·인력·예산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부각하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회원사 215개 기업의 안전관리 실무자 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4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25.7%) △행정·경제적 부담(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8.1%) 등이 이었다.
특히 기업 담당자들 10명 중 8명(77.5%)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고 봤으며 해당 응답자의 대부분(94.6%)은 추후 법 개정이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 경총이 중소기업중앙회와 314개 국내 기업( 50~300인 미만 중소기업 249개+300인 이상 대기업 65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응답 기업의 74.2%가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을 꼽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장인력 쓰임이 많은 기업들은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그룹 화학부문 주력계열사 롯데케미칼은 최근 강화된 안전규정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을 안전환경에 투자해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핵심이다.
조선·철강 중공업사들도 일제히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기존 안전조직을 늘리는 한편 담당 임원의 숫자도 늘려가고 있다.
방산업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사업장 별 위험성 평가 및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새로 선임해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은 물론이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도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안전전담조직 출범을 준비 중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단독] 한화생명, ‘파파고’ 만든 김준석 AI 전문가 영입](https://cdnimage.ebn.co.kr/news/202403/news_1710146291_1615548_c.jpg)





![[은행 & NOW] 우리銀, 글로벌 455조원 푸드테크 시장 공략 금융지원 등](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7227761_1637901_c.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