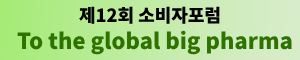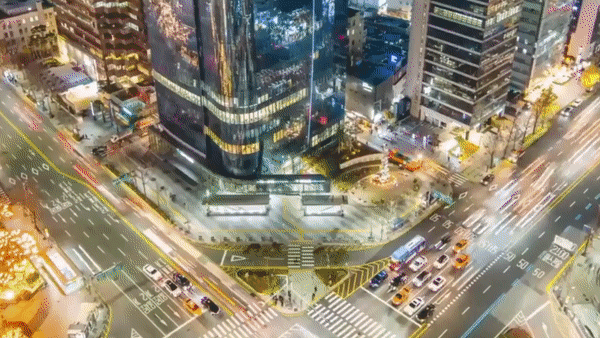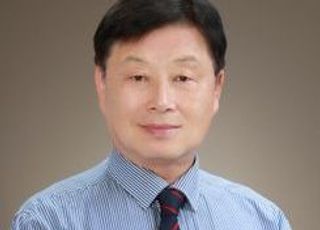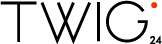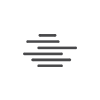
- 텍스트 축소
- 확대
[기자수첩] 약사들의 노고를 폄하하지 마라
- 송고 2020.03.11 14:12 | 수정 2020.03.11 14:14
-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이따금 선의에서 시작된 행동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 보통 상황적 특수성이 더해지거나 이전에 있었던 맥락 따위가 영향을 미친다. 단, 오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때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 약사들이 받는 오해가 그러하다.
약사들의 선의가 왜곡된 것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 역할을 하면서부터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공적 마스크는 주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 업체와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지정한 유통 채널을 거쳐 약국에 공급되는 방식이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이후 약국에선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해 해당 요일에 맞는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중복 구매를 방지한다.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공적마스크 공급권·가격구조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공적 마스크 계약 단가는 장당 900~1000원이다. 정부 지정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공적 마스크를 1100원에 공급한다.
계약 단가와 납품가격이 공개되자 언론을 중심으로 약사들이 마스크를 판매해 하루에 10만원의 차액을 거둔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국 한 곳당 평균 250장의 마스크가 공급되고, 한 장당 1500원에 판매하면 평균 1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우선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마스크 판매로 하루 10만원을 번다는 말은 단순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카드 수수료 2.8%와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장당 10원 정도에 그친다는 게 약사들 주장이다.
수익 발생 여부를 떠나 약사들이 억울한 지점은 따로 있다. 공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주된 업무인 일반 조재도 마다하는데, 공적 마스크 판매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시각이다.
하루 10만원을 챙긴다며 내몰린 약사들은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원성으로 또 한 차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심한 경우 마스크를 뒤로 빼놓는 것 아니냐는 추궁도 감내해야 한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대리구매를 거부하자 마스크를 몰래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설전이 오갔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3일 뒤 다른 약국에선 마스크가 조기 소진되자 낫을 들고 약사를 협박한 사람이 검거됐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돌아가자 몇몇 약사들은 가게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 판매에 따른 수익이 적은 데 비해 들어가는 품이 많다는 등의 이유가 아니다. 자신들이 베푼 선의가 당연한 노동,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던 영화 대사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도 대부분의 약사들은 아침이 되면 가게 문을 열고 마스크를 납품받아 판매 준비를 한다. 물론 마스크를 팔아 마진을 남기겠다는 이유도, 왜 마스크를 팔지 않느냐는 꾸중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방역과 검사, 치료에 힘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약사들의 노고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길 바란다. '시국이 시국인데도' 낯선 사람들을 매일 맞이하면서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한테 욕하고 말 퍼뜨리고 그랬겠어요. 저만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힘 닿는 데까지 애써봐야죠." 어제 저녁 가게 문을 닫는 약사가 한숨과 함께 내쉰 말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Pharm & Now] 광동제약, 제주 환경 돌봄 ‘주스멍 도르멍’ 4기 진행 등](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7673777_1638511_c.jpeg)

![[보험 & NOW] MG손해보험, '한가위 맞이 풍성한 추석선물 나눔' 진행 등](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5866533_1636453_c.jpeg)
![[증권 & Now] 신한투자증권, 추석 연휴 글로벌 데스크 24시간 운영 등](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5604262_1636235_c.jpeg)




![[금융 & NOW] KB금융, 부산시와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 협약 등](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6124010_1636907_c.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