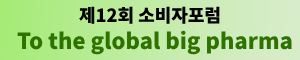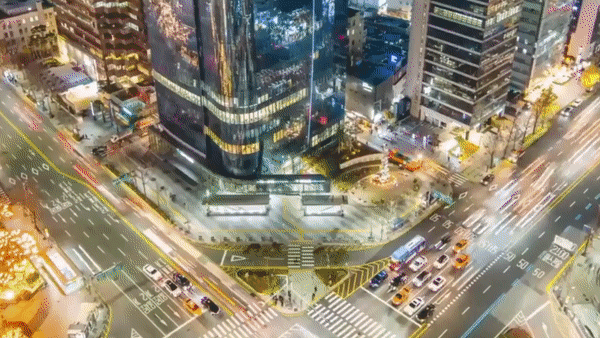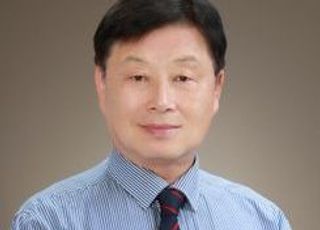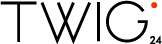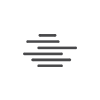
- 텍스트 축소
- 확대
[기자수첩] 근거 없는 분양가상한제 괴담…본질에 집중할 때
- 송고 2019.07.22 15:24 | 수정 2019.07.22 15:26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김재환 기자/건설부동산팀
"주택공급량이 줄어서 오히려 집값이 뛴다.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너무 싸서 로또 청약 광풍이 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려하자 각종 반대 여론이 들끓는 모습이다.
공급위축설부터 로또광풍설 등 과거 사례나 지표와 관계없이 설득력 떨어지는 '카더라 식' 주장이 만연해 안타깝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의 폭주를 억제하기 위한 본래 법 취지와 도배된 주장 뒤에 숨은 빈약한 근거들을 드러낼 때다.
기본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자. 우선 분양가격을 건설원가와 사업자의 적정한 이윤으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이번 정부 작품이 아니다.
2008년 처음 시행됐고 2015년에 개정됐다. 이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높은 집값상승률이 3개월 이상 지속할 때"라는 단서가 달렸다.
사실 이 단서조항이야 말로 분양가상한제의 본래 법 취지를 무력화한 조처다. 실제로 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던 송파구(15.51%)조차 위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2.8배 높은 9.8%까지 폭등했지만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단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현 정부가 하려는 일은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선행조건을 완화하는 작업이지 당장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전 지역에 선포하려는 게 아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정상적인 시세변동 수준을 넘어선 일부 지역의 분양가와 집값을 관리하는 본래 법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론은 마치 집값과 분양가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번 정부가 아무런 제한 없이 당장 서울 전역에 분양가상한제도를 도입한다는 추측으로 도배되고 있다.
설령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치자, 과연 공급이 유의미하게 위축되거나 로또 청약을 노린 투기수요로 집값이 폭등하게 될까?
그렇지 않으리라는 게 지난 지표들의 증언이다. 전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선행조건을 개정하기 전인 2008년과 2014년의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 중윗값은 5억 후반대에서 초반 사이를 등락했을 뿐이다.
오히려 2015년 5억원 중반대에서 4년 만에 8억원 초반까지 치솟은 걸 보면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집값이 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급량 선행지표인 서울 인허가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2004년부터 박근혜 정부의 제도 손질 이후, 그리고 지난해까지도 4만호 초반에서 5만호 중반 사이를 움직이며 크게 변한 적이 없다.
현실을 직시하자. 지난달 기준 1년 동안 공급된 서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나 뛰었다.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의 3배를 넘는 '폭등'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내버려둘 순 없는 노릇이다.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은 분양가와 시세의 과도한 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 부작용 탓에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거부한다는 논리로 현재 비정상적인 시장에 필요한 처방을 거부해선 안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기자수첩] 게임 시장 흔드는 ‘언더독 반란’…한국도 기회는 있다](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5515322_1636047_c.jpeg)